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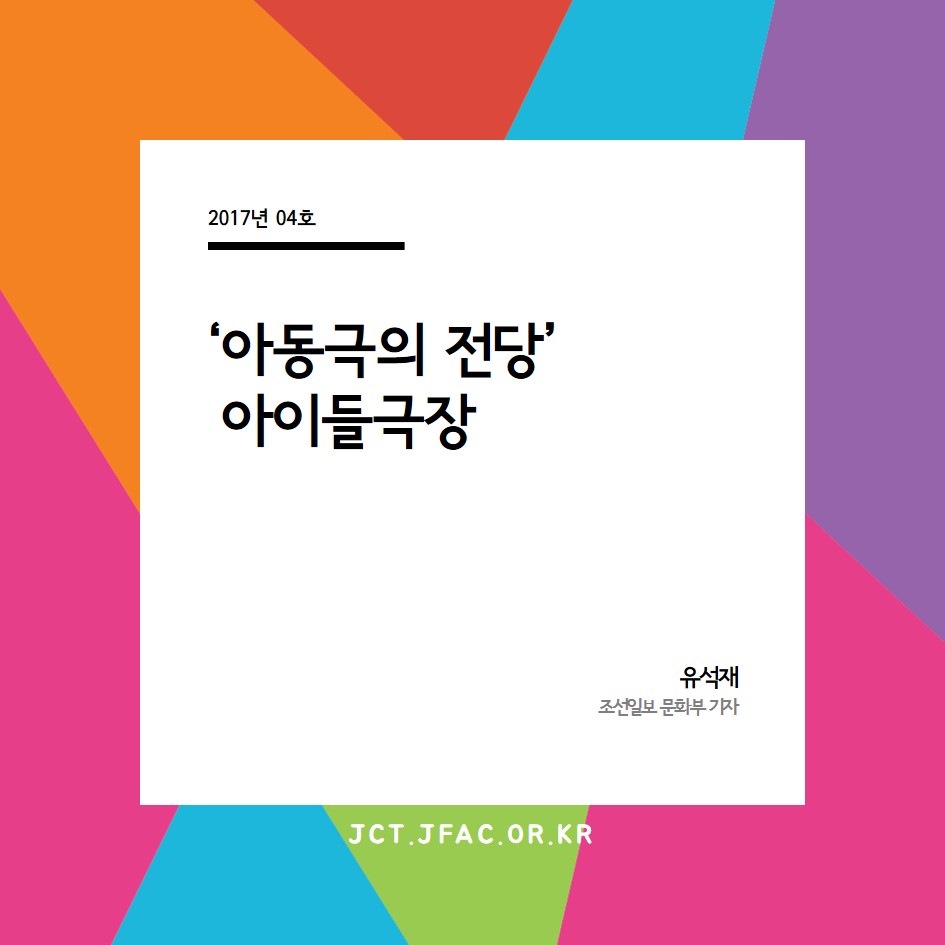 |
언론에는 ‘최초’를 선호하는 속성이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특종 기사가 돌연 비중이 작아졌던 사연은 바로 그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김숙희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아시테지코리아) 이사장으로부터 ‘최초의 어린이 전용극장’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5년 가을이었다.
필자는 평소 아동극 제작자인 가수 유열씨로부터 아동극과 아동극 전용극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십분 공감하고 있었다.
“연극에는 무대 미술, 영상 디자인, 안무, 빛, 음악, 연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공연들을 보거나 직접 참여하면서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인성과 정서를 키우게 됩니다. 나아가 왕따, 학교 폭력, 자살, 소시오패스 같은 청소년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까지 될 수 있습니다.” 딸아이 손을 붙잡고 ‘그저 그런’ 아동극을 숱하게 보러 갔던 필자는 유열 대표의 이 열정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 세대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동극 전용 극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란 생각까지 했다.
김숙희 대표가 지나가는 말처럼 흘린 ‘전용극장’에 외마디 비명을 지를 뻔했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건 제 특종입니다.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그해 연말, 마침내 기사를 쓸 때가 됐다. 그런데 대문짝만하게 ‘국내 첫 어린이 전용극장’이라고 쓰려던 계획이 좌절됐다. 취재를 해 보니 석 달 전인 9월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때는 아시아예술극장 같은 다른 이슈들에 가려 미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다)이 개관했고, 그 직전인 11월에는 부산 기장에 연출가 이윤택씨가 안데르센극장의 문을 열었던 것이다(이윤택씨는 틈만 나면 입버릇처럼 ‘나 이제 부산 내려가서 아동극 할 거야’라고 했다).
 <사진 1> 아이들극장의 주인공 어린이관객 <사진 1> 아이들극장의 주인공 어린이관객
|
 <사진 2> 아이들극장의 주인공 어린이관객 <사진 2> 아이들극장의 주인공 어린이관객 |
결국 기사는 조선일보 2015년 12월 3일자 A23면에 2칼럼 크기로 <‘오프 대학로’에 수도권 첫 어린이 전용 극장>이란 제목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 극장의 산파역이자 예술감독인 김숙희 대표의 목소리는 최대한 반영했다. “수준을 갖춘 아동극을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른 공연장에 방석 몇 개 깔고 운영하던 기존 공연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계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별 관심을 끌 기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뜻밖에도 국내 연극학계의 원로인 유민영 서울예대 명예교수가 전화를 했다. “유 차장! 아주 뜻깊은 기사를 썼어요. 오늘아침 신문 지면에서 제일 돋보입디다. 어린이 극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광주와 부산에 내려가 보니 각각 자기 고장에 세워진 어린이극장을 ‘국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설마 서울에 아직도 어린이 전용극장이 없을까’란 생각에 아직 짓지 않은 서울 종로의 어린이극장이 이미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2016년 4월 30일 ‘종로 아이들극장’이 개관했다. 처음 극장을 본 느낌은 “드디어 아동극의 전당(殿堂)이 생겼구나!”란 것이었다. 좌우 길이 15m, 깊이 8m에 이르는 무대는 웬만큼 스케일이 큰 어린이극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널찍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철저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졌다’는 배려심의 발로였다. 분명 중극장 규모의 공간이지만 객석은 채 300석이 되지 않았다. 촘촘히 배치하지 않고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좌석 앞뒤 공간이 0.8m, 객석 경사 35도로 시야를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란 도시는 그 규모에 걸맞지 않는 ‘결핍’의 요소가 또 하나 줄어들었다. 뉴욕의 빅토리시어터나 런던 폴카시어터, 도쿄 어린이의 성처럼 수준 높은 아동극을 1년 내내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그것도 한국 연극의 본향(本鄕)이라 할 대학로 외곽 ‘오프 대학로’에 말이다.
 <사진 3> 개관1주년 기념공연 「엄마 이야기」 <사진 3> 개관1주년 기념공연 「엄마 이야기」
|
 <사진 4> 개관1주년 기념공연 「엄마 이야기」 <사진 4> 개관1주년 기념공연 「엄마 이야기」 |
지난 1년 동안 이 극장은 상업성 대신 작품성을 갖춘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개관작 ‘무지개섬 이야기’, 우수 인형극을 망라한 ‘키우피우 인형극축제’와 두 차례의 아시테지 아동극 축제의 무대가 바로 이곳이었다. 필자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지난해 여름 아시테지 축제 중 일본 극단의 ‘피노키오’였다. 장시간 펼쳐진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넓은 무대에서 파노라마처럼 흘렀고 어린 관객들은 몰두했다. 지금은 연출가 한태숙, 배우 박정자라는 한국 연극계의 간판스타들이 참여한 ‘엄마 이야기’가 1주년 기념작으로 공연 중이다.
개관과 1년 동안의 운영으로 아이들극장의 틀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1년 내내 언제든지 아이들극장에 찾아가면 수준 높은 어린이극을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관 공연을 포함한 가동률을 지금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석의 콘셉트를 ‘아이들끼리 보는 곳’과 ‘가족 단위로 보는 곳’ 중에서 한 가지로 분명히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아이와 함께 온 어른들이 같이 앉아서 보기엔 객석이 너무나 좁고, 맨 뒷줄 성인용 의자에 앉아서 볼 수 있으나 그곳은 몇 자리 되지 않는다.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17년 봄, 어린이극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이제는 달라질 만한 토대가 갖춰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척 기쁘다. 대충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상업극이나 저가 단체 관람 공연이 아니라, 그야말로 작품성을 갖춘 제대로 된 어린이극을 상설 공연하는 극장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 간명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표어를 하나 제안해 보겠다.
“어린이연극은 아이들극장, 혜화동 아이들극장!”

1990년대 초부터 공연 마니아로 대학로를 들락거렸다. 2000년대 중반 AV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학술, 출판, 문화재를 담당했고, 사회정책부에서 교육부를 출입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조선일보 문화부 공연 담당 기자로서 매일 저녁이 되면 수첩과 오페라글라스를 들고 어두컴컴한 어느 공연장 객석에 앉아 있을 확률이 95%였고, 지금은 다시 초야의 관객으로 돌아왔다.
댓글작성